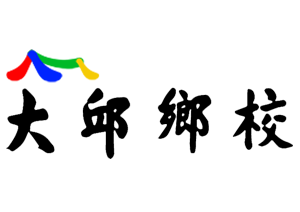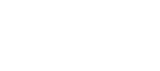東洋 古典 한마디 42. 或曰 雍也는 仁而不佞이로다
혹왈(或曰) 옹야(雍也)는 인이불녕(仁而不佞)이로다.
혹자가 말하기를 옹은 인하나 말재주가 없습니다. 옹은 공자의 제자이니, 성은 염(冉)이고 字는 중궁(仲弓)이다. 佞은 말재주이다. 중궁의 사람됨이 중후하고 소탈(簡) 과묵하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으므로 그가 德에 뛰어나 남을 찬미하면서도 그의 말재주가 부족한 것을 흠으로 여긴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니, 그가 仁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어(禦)는 당(當, 상대 또는 막는 것)하는 것이니, 남의 말에 응답하는 것과 같다. 급(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증(憎)은 미워함이다. 말재주는 어디에 쓰겠는가? 구변 좋은 사람이 남과 응답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약삭빠르게 말하여 이기기를 취할 뿐이요, 실정(實情)이 없어서 한갓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많을 뿐이다. 내 비록 仲弓이 仁 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의 말재주가 없음은 바로 훌륭함이 되는 것이요 흠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은 깊이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중궁의 어짊으로도 부자께서 그의 仁을 허여하지 않으심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仁의 道는 지극히 커서 전체가 인이고 그침이 없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 顏子자와 같은 亞聖으로서도 오히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인을 떠남이 없지 못하였다. 더구나 仲弓은 비록 어질다고 하지만 顏子에 미치지 못하니, 성인께서 참으로 가볍게 허여하실 수 없는 것이다.
♠ 능변이면 상대방이 시원하게 말을 참 잘한다고 여기지만 눌변(訥辯)이라도 진심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무게가 있어 상대방에 깊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혹왈(或曰) 옹야(雍也)는 인이불녕(仁而不佞)이로다.
혹자가 말하기를 옹은 인하나 말재주가 없습니다. 옹은 공자의 제자이니, 성은 염(冉)이고 字는 중궁(仲弓)이다. 佞은 말재주이다. 중궁의 사람됨이 중후하고 소탈(簡) 과묵하였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것을 훌륭하게 여겼으므로 그가 德에 뛰어나 남을 찬미하면서도 그의 말재주가 부족한 것을 흠으로 여긴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약삭빠른 구변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니, 그가 仁한지는 모르겠으나, 말재주를 어디에 쓰겠는가?”
어(禦)는 당(當, 상대 또는 막는 것)하는 것이니, 남의 말에 응답하는 것과 같다. 급(給)은 말을 잘하는 것이다. 증(憎)은 미워함이다. 말재주는 어디에 쓰겠는가? 구변 좋은 사람이 남과 응답하는 것은 단지 입으로 약삭빠르게 말하여 이기기를 취할 뿐이요, 실정(實情)이 없어서 한갓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많을 뿐이다. 내 비록 仲弓이 仁 한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그의 말재주가 없음은 바로 훌륭함이 되는 것이요 흠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말재주를 어디에다 쓰겠는가?”라고 다시 말씀하신 것은 깊이 깨우치려고 하신 것이다.
*혹자가 말하기를 “중궁의 어짊으로도 부자께서 그의 仁을 허여하지 않으심은 어째서인가? 하였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仁의 道는 지극히 커서 전체가 인이고 그침이 없는 자가 아니고서는 이에 해당할 수 없다. 顏子자와 같은 亞聖으로서도 오히려 3개월이 지난 뒤에는 인을 떠남이 없지 못하였다. 더구나 仲弓은 비록 어질다고 하지만 顏子에 미치지 못하니, 성인께서 참으로 가볍게 허여하실 수 없는 것이다.
♠ 능변이면 상대방이 시원하게 말을 참 잘한다고 여기지만 눌변(訥辯)이라도 진심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무게가 있어 상대방에 깊이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